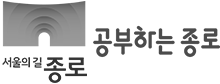4월 인문학교육_4교시 다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09
조회: 890
추천: 1
4월 인문학교육_4교시 다례
[자막]
4교시 다례(茶禮) :
반갑습니다. 차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보면
신농씨 (神農氏)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방을 다스리던 신이자 소전의 아들이다.
또한 농업, 의약, 약초의 신) 라고 신농씨 자체가 농사의 농자가 들어가잖아요. 농사의 신이에요.
반갑습니다. 차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보면
신농씨 (神農氏)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방을 다스리던 신이자 소전의 아들이다.
또한 농업, 의약, 약초의 신) 라고 신농씨 자체가 농사의 농자가 들어가잖아요. 농사의 신이에요.
대체 텍스트 (웹 접근성용):
중국 지도 실루엣 왼쪽에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신농씨로 묘사된 인물 두 명이 나무, 약초, 불, 바구니 등과 함께 등장한다.
오른쪽 상단에는 “BC 2737”이라는 연대가 적혀 있다.
중국 지도 실루엣 왼쪽에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신농씨로 묘사된 인물 두 명이 나무, 약초, 불, 바구니 등과 함께 등장한다.
오른쪽 상단에는 “BC 2737”이라는 연대가 적혀 있다.
텍스트 내용:
신농씨(神農氏)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방을 다스리던 신이자 소전의 아들이다. 또한 농업, 의약, 약초의 신이다.
신농씨(神農氏)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남방을 다스리던 신이자 소전의 아들이다. 또한 농업, 의약, 약초의 신이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중국의 전설적인 신 중의 한 명 인데요.
수렵채취하던 시대에 농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100살까지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일찍 죽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직접 신농씨가 맛을 보고 약초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풀들을 먹다 보니까 사실 풀들에 독이 많잖아요. 독성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파리를 먹었는데 이게 좀 나아지더라.
그게 차 나무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에는 해독작용 하고 어떤 살균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수렵채취하던 시대에 농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100살까지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일찍 죽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풀들을 직접 신농씨가 맛을 보고 약초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풀들을 먹다 보니까 사실 풀들에 독이 많잖아요. 독성에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와중에 어떤 이파리를 먹었는데 이게 좀 나아지더라.
그게 차 나무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에는 해독작용 하고 어떤 살균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체 텍스트:
중국 지도 실루엣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오른쪽에는 신농씨가 약초와 불 옆에 앉아 있는 삽화가 있다.
중국 지도 실루엣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오른쪽에는 신농씨가 약초와 불 옆에 앉아 있는 삽화가 있다.
왼쪽:
석가모니
BC 560
“차의 기원이 명상의 용도인 각성제로 시작되었다는 설화”
석가모니
BC 560
“차의 기원이 명상의 용도인 각성제로 시작되었다는 설화”
오른쪽:
신농씨 (神農氏)
BC 2737
“차의 기원이 약초로써 시작되었다는 설화”
신농씨 (神農氏)
BC 2737
“차의 기원이 약초로써 시작되었다는 설화”
그런 의학용의 약초로서 처음에 인류가 먹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각성의 효과 정신적인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료로서 인류가 처음에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하늘에 제사)
(차[茶] :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 하늘·산천·조상님께 제 올리는 제수로 삼음 [차례]) 에 이제 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음료로서 인류가 처음에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하늘에 제사)
(차[茶] :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 하늘·산천·조상님께 제 올리는 제수로 삼음 [차례]) 에 이제 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대체 텍스트:
제목: 고조선: 제천의식(하늘에 제사)
설명:
차(茶)는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하늘·산천·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수로 사용되며 이를 차례라 한다.
제목: 고조선: 제천의식(하늘에 제사)
설명:
차(茶)는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하늘·산천·조상님께 제사를 올리는 제수로 사용되며 이를 차례라 한다.
왼쪽 이미지: 하늘을 배경으로 전통 흰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장면.
중심 인물이 흰 깃발을 들고 있다.
중심 인물이 흰 깃발을 들고 있다.
오른쪽 이미지: 제사를 지내는 장면. 상 위에는 돼지머리, 과일, 음식 등 제수 음식들이 놓여 있으며,
한 인물이 술잔을 올리고 다른 이들이 절을 하고 있다.
한 인물이 술잔을 올리고 다른 이들이 절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경천사상의 경천사상(敬天思想)
(하늘을 공경하는 종교적 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것)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 이죠.
(하늘을 공경하는 종교적 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것) 하늘을 공경하는 사상 이죠.
대체 텍스트:
제목: 경천사상 (敬天思想)
설명:
"하늘을 공경하는 종교적 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것."
제목: 경천사상 (敬天思想)
설명:
"하늘을 공경하는 종교적 사상.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는 것."
오른쪽 이미지: 수많은 인물이 전통 복장을 입고 깃발을 들고 긴 계단을 오르고 있다. 가장 앞의 인물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경건한 자세로 나아간다.
구름 낀 푸른 하늘 아래 장엄하고 질서 정연한 행렬이 이어짐.
구름 낀 푸른 하늘 아래 장엄하고 질서 정연한 행렬이 이어짐.
아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곧 나를 공경하고 나를 존중하는 차라는 것은 이런 신성하고 성스러운 것으로서 하늘 산천조상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공경의 의미로 하는 제수로 삼은 것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초의선사(草依禪師) 우리나라에는 고래로 장백산에 백산차가 있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공경의 의미로 하는 제수로 삼은 것이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고 초의선사(草依禪師) 우리나라에는 고래로 장백산에 백산차가 있었다.
대체 텍스트:
제목: 초의선사 (草衣禪師)
설명: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장백산에 백산차가 있었다.
제목: 초의선사 (草衣禪師)
설명: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장백산에 백산차가 있었다.
중앙 이미지: 흰 배경 안에 세 송이의 연한 녹색 꽃봉오리를 가진 식물(백산차) 클로즈업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가늘고 길게 뻗은 잎과 줄기 위에 꽃이 피어 있다.
라고 조선 후기 에 되게 다성이라고 불리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장백산이라고 하면 백두산이자 백두산의 백산차라는 차가 있었 다 라고 문헌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장백산이라고 하면 백두산이자 백두산의 백산차라는 차가 있었 다 라고 문헌에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각저총(고구려 각저총 벽화 : 고구려 무사가 두 여인에게 차를 대접받는 모습)
대체 텍스트:
제목: 고구려 각저총 벽화
설명:
고구려 무사가 두 여인에게 차를 대접받는 모습과, 고구려의 전통 씨름 경기인 '각저(角抵)' 장면이 벽화로 묘사되어 있음.
제목: 고구려 각저총 벽화
설명:
고구려 무사가 두 여인에게 차를 대접받는 모습과, 고구려의 전통 씨름 경기인 '각저(角抵)' 장면이 벽화로 묘사되어 있음.
왼쪽 그림: 벽화에 표현된 두 사람이 서로 부딪혀 힘을 겨루는 장면. 이는 ‘각저(角抵)’로, 고구려 시대 씨름의 원형을 나타냄. 당시 운동 경기의 일종임.
오른쪽 그림: 고구려 무사가 바닥에 앉아 있으며, 두 명의 여인이 무사에게 차를 대접하고 있음. 실내 공간에서의 차 문화 장면으로 보임. 벽화 일부는 훼손되어 있음.
보조 설명:
‘각저’는 오늘날 씨름 경기의 기원이며, 두 사람이 몸을 부딪혀 넘어뜨려 승패를 가림.
고구려 벽화는 당시의 생활, 의례, 차 문화 등을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
각저(角抵) 두 사람이 달려들어 힘을 겨루고 재주를 부려 먼저 넘어뜨려서 승패를 결정하는 운동경기로 오늘날의 씨름경기의 원형 이라고 하는 것은 씨름을 각저라고 하는데요.
씨름을 하는 그 행위를 거기 벽화에 보면 그 고구력 무사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무사가 두 여인하게 차를 대접받는 모습이 벽화 에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귀족문화나 일상 평민들도 차를 많이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씨름을 하는 그 행위를 거기 벽화에 보면 그 고구력 무사가 지금 제일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무사가 두 여인하게 차를 대접받는 모습이 벽화 에 그림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귀족문화나 일상 평민들도 차를 많이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차 하면 스님들이 많이 애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석가모니님께서 각성을 위해서 차를 애용한 것처럼 특히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용성했던 시대잖아요.
아까 석가모니님께서 각성을 위해서 차를 애용한 것처럼 특히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용성했던 시대잖아요.
대체 텍스트:
제목: 신라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석굴암 문수보살상
설명: 신라 시대의 석조 불상 유물로, 부처님께 차를 공양(올리는)하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
제목: 신라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석굴암 문수보살상
설명: 신라 시대의 석조 불상 유물로, 부처님께 차를 공양(올리는)하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
왼쪽 부조상: 왼손에 찻잔을 들고 공손히 앉아 있는 모습. 머리 뒤에 광배(빛을 상징하는 원형)가 있음. 정교한 의복 주름이 조각되어 있음.
오른쪽 부조상: 양손을 모으고 있으며, 역시 광배가 있으며, 얼굴과 신체 윤곽은 다소 마모됨. 전체적으로 차를 공양하는 차례 장면을 표현하고 있음.
보조 설명:
해당 유물은 신라 불교의 차례(茶禮) 문화와 공양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석조유물로, 신앙과 일상생활의 융합을 나타냄.
해당 유물은 신라 불교의 차례(茶禮) 문화와 공양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석조유물로, 신앙과 일상생활의 융합을 나타냄.
그 시대상과 맞물려서 차가 많이들 애용이 됐습니다. 차를 석가모니님에게 공량하는 그런 것이 조각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
제목: 문수보살상 (文殊菩薩像)
설명:
석굴암 석조에서 발견된 문수보살상의 부조(부조각).
오른손에 찻잔을 들고 있으며, 얼굴에는 자비로운 표정이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다.
제목: 문수보살상 (文殊菩薩像)
설명:
석굴암 석조에서 발견된 문수보살상의 부조(부조각).
오른손에 찻잔을 들고 있으며, 얼굴에는 자비로운 표정이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다.
머리 뒤에는 원형의 광배(光背, 후광)가 새겨져 있음.
의복은 부드럽고 섬세한 곡선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손에는 찻잔을 공손히 쥐고 있음.
보살상은 연꽃 위에 서 있는 듯한 자세로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있으며, 이는 중앙 석가모니불에게 차를 공양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
보조 설명:
이 장면은 고대 불교에서 차 공양이 신성한 제례행위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며,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정성을 다한 차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 장면은 고대 불교에서 차 공양이 신성한 제례행위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며,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정성을 다한 차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술이나 차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오리모양 같은 경우는 예로 부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강을 건넌다고 하거든요.
대체 텍스트:
제목: 신라 오리형 토기잔 (의례용 장례 잔)
설명:
신라 시대의 유물로, 오리 모양을 본뜬 의례용 토기잔이다.
갈색 흙으로 제작되었으며, 몸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태로 되어 있다.
제목: 신라 오리형 토기잔 (의례용 장례 잔)
설명:
신라 시대의 유물로, 오리 모양을 본뜬 의례용 토기잔이다.
갈색 흙으로 제작되었으며, 몸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형태로 되어 있다.
머리는 오리의 긴 목과 부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등 부분에는 원통형 잔이 올라가 있는 구조로, 음료나 제물을 따르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꼬리 부분은 짧고 둥글며 전체적으로 유려한 곡선이 돋보인다.
받침대는 안정감을 주는 평평한 원형 형태로, 이동 없이 고정된 상태로 제례에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 설명:
이 오리형 토기잔은 **장례식 의식(의례용)**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늘과 조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오리는 하늘과 물, 땅을 모두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술적·제의적 기능이 강조된 유물이다.
장례와 같은 의례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데 사용된 후 매장되었을 것
이 오리형 토기잔은 **장례식 의식(의례용)**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늘과 조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오리는 하늘과 물, 땅을 모두 연결하는 신성한 매개체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술적·제의적 기능이 강조된 유물이다.
장례와 같은 의례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데 사용된 후 매장되었을 것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강을 오리는 왔다가 할 수 있는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
제목: 영혼 전달자인 오리
설명:
유리 케이스에 전시된 신라 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잔.
이 토기는 오리의 몸체를 본뜬 형태로,
제목: 영혼 전달자인 오리
설명:
유리 케이스에 전시된 신라 시대의 오리 모양 토기잔.
이 토기는 오리의 몸체를 본뜬 형태로,
몸 위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원형 구멍이 있음.
머리와 꼬리, 목이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어 실제 오리와 유사한 인상을 줌.
받침대는 평평하고 안정적으로 제작됨.
텍스트 요약 설명:
오리는 물, 땅, 하늘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고 여겨져 영혼의 전달자로 신성시됨.
이러한 상징 때문에 오리형 토기잔은 장례나 제사 등 의례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데 쓰이고 이후 무덤에 함께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데 쓰이고 이후 무덤에 함께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고려시대 : 차문화 성행 (고려청자 사진) 왕실차 : 진다 의식 (進茶) 국가적인 행사에 차를 올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용성과 함께 고려시대에 있는 차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진다 의식이라고 해서 왕실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를 올리는 행위를 하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용성과 함께 고려시대에 있는 차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진다 의식이라고 해서 왕실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를 올리는 행위를 하였어요.
대체 텍스트: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왕실차: 진다 의식(進茶)
이미지 설명:
연녹색 고려청자로 만든 다기(차기구) 세트.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왕실차: 진다 의식(進茶)
이미지 설명:
연녹색 고려청자로 만든 다기(차기구) 세트.
위쪽에는 연꽃 모양의 찻잔이 있고,
아래는 그 찻잔을 받치는 정교한 받침대와 넓은 접시 형태의 받침이 함께 구성됨.
전체 구조는 세 단 구성이며, 모두 같은 고려청자 재질로 제작됨.
차를 올릴 때 쓰이던 고급 왕실용 다기 세트를 보여줌.
부가 설명:
고려시대에는 차문화가 성행하였으며,
국가적 행사나 왕실 의례에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 의식이 행해졌음.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대표적 도자기로, 정교한 조각과 청록빛 유약이 특징임.
고려시대에는 차문화가 성행하였으며,
국가적 행사나 왕실 의례에 차를 올리는 진다(進茶) 의식이 행해졌음.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대표적 도자기로, 정교한 조각과 청록빛 유약이 특징임.
차를 올리는 행위를 다방이라고 합니다.
대체 텍스트:
제목: 다방(茶房) – 궁중의 차 담당 기관
제목: 다방(茶房) – 궁중의 차 담당 기관
이미지 설명:
오른쪽에는 고대 궁중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으며, 두 명의 관리가 차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
한 인물은 찻잔을 받들고 있고, 다른 인물은 물병(또는 다관)을 들고 있음.
배경에는 다기류와 식기들이 진열된 탁자와 궁중 실내 장식이 보임.
오른쪽에는 고대 궁중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으며, 두 명의 관리가 차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음.
한 인물은 찻잔을 받들고 있고, 다른 인물은 물병(또는 다관)을 들고 있음.
배경에는 다기류와 식기들이 진열된 탁자와 궁중 실내 장식이 보임.
부가 설명: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의식'이 행해졌으며,
궁중 연회나 공식 행사를 위해 **차를 전담하던 기관인 ‘다방(茶房)’**이 존재했음.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의식'이 행해졌으며,
궁중 연회나 공식 행사를 위해 **차를 전담하던 기관인 ‘다방(茶房)’**이 존재했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다방이죠.
다방(茶房)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의식이 행해졌으며,
궁중연회나 의식이 잇을 때 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다방'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었다. (다방의 그림 사진)
다방(茶房)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의식이 행해졌으며,
궁중연회나 의식이 잇을 때 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다방'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었다. (다방의 그림 사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불장에 차 공양하는 헌다의 형식으로도 차문화가 굉장히 성행했고
대체 텍스트: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사원차: 헌다(獻茶)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사원차: 헌다(獻茶)
이미지 설명:
고려청자로 제작된 연꽃 모양의 찻잔과 받침대가 화면 중앙에 배치되어 있음.
찻잔은 연꽃잎 형태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아래 받침은 둥근 접시 형태로 잔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음.
차도구 전체가 청록색 빛깔로 은은하게 빛남.
고려청자로 제작된 연꽃 모양의 찻잔과 받침대가 화면 중앙에 배치되어 있음.
찻잔은 연꽃잎 형태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아래 받침은 둥근 접시 형태로 잔을 안정적으로 받치고 있음.
차도구 전체가 청록색 빛깔로 은은하게 빛남.
부가 설명:
고려시대에는 사원(절)에서 불전에 차를 올리는 헌다(獻茶) 의식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 차도구는 조석(불교의식)에서 사용된 헌다용 고려청자임.
고려시대에는 사원(절)에서 불전에 차를 올리는 헌다(獻茶) 의식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 차도구는 조석(불교의식)에서 사용된 헌다용 고려청자임.
일반 사람들은 약용으로 아이들의 배가 아프거나 이러면 발효차를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대체 텍스트: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서민차: 약용 음다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서민차: 약용 음다
이미지 설명:
청자 연꽃 형태의 찻잔과 받침대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가 옥빛을 띠는 고려청자로 제작됨.
찻잔은 연꽃잎 형태의 곡선적인 디자인이며, 받침대는 안정된 받침 구조를 갖춘 접시 모양.
청자 연꽃 형태의 찻잔과 받침대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가 옥빛을 띠는 고려청자로 제작됨.
찻잔은 연꽃잎 형태의 곡선적인 디자인이며, 받침대는 안정된 받침 구조를 갖춘 접시 모양.
부가 설명:
고려시대에는 서민들도 차를 마셨으며, 특히 아이들의 배가 아플 때 잣설차(발효차) 를 약처럼 끓여 마셨다는 구례의 예시를 통해
차가 약용 음료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서민들도 차를 마셨으며, 특히 아이들의 배가 아플 때 잣설차(발효차) 를 약처럼 끓여 마셨다는 구례의 예시를 통해
차가 약용 음료로도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차문화의 성행과 함께 고려청자 굉장히 유행을 하였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차문화하면 유명한 데가 영국에 본차이나 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영국에는 귀족 중심에 차문화가 성행하면서 도자기 가 같이 발달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차문화하면 유명한 데가 영국에 본차이나 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영국에는 귀족 중심에 차문화가 성행하면서 도자기 가 같이 발달을 하게 됐거든요.
대체 텍스트:
제목: 본차이나 / 골회자기 (骨灰磁器)
제목: 본차이나 / 골회자기 (骨灰磁器)
이미지 설명:
화려한 금장 장식과 꽃무늬가 정교하게 그려진 서양식 본차이나 도자기 세트.
발이 달린 뚜껑 있는 찻그릇과 비대칭 장식 접시가 함께 놓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흰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꽃문양이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음. 금빛 손잡이와 테두리 장식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함.
화려한 금장 장식과 꽃무늬가 정교하게 그려진 서양식 본차이나 도자기 세트.
발이 달린 뚜껑 있는 찻그릇과 비대칭 장식 접시가 함께 놓여 있으며, 전체적으로 흰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꽃문양이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음. 금빛 손잡이와 테두리 장식이 고급스러움을 강조함.
부가 설명:
18세기 초, 영국에서 차 문화가 보편화되자 값비싼 중국 도자기를 대체하기 위해
소의 뼛가루를 주원료로 한 도자기인 본차이나가 개발됨.
이 본차이나는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었고, 이후 유럽 전역에 확산됨.
18세기 초, 영국에서 차 문화가 보편화되자 값비싼 중국 도자기를 대체하기 위해
소의 뼛가루를 주원료로 한 도자기인 본차이나가 개발됨.
이 본차이나는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었고, 이후 유럽 전역에 확산됨.
본차이나/골회자기(骨灰磁器) 18세기 초 영국에서 차가 보편화되고 도자기 수요가 늘게되자 영국 도공들은 값비싼 중국산 도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소의 뼛가루를 주 성분으로 제조한 도자기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
소의 뼛가루를 주 성분으로 제조한 도자기로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었다.
그래서 그 본차이나 라고 하는 것이 뼈를 만드는 거잖아요 뼈를 갈아서 가볍고 단단하고
그리고 차 빛깔이 맑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급 도자기 를 만든 본차이나가 유행하였듯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고려청자라는 차를 만드는 잔에다 굉장히 공을 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빛깔이 맑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급 도자기 를 만든 본차이나가 유행하였듯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고려청자라는 차를 만드는 잔에다 굉장히 공을 들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고려청자
제목: 고려시대: 차문화 성행 – 고려청자
이미지 설명:
연녹색빛이 도는 아름다운 고려청자 찻잔과 받침대.
찻잔은 연꽃 모양으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받침대는 넓고 둥글며 중앙에 장식이 새겨져 있음.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정교한 형태로, 고려시대 귀족의 차문화 수준을 보여줌.
연녹색빛이 도는 아름다운 고려청자 찻잔과 받침대.
찻잔은 연꽃 모양으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받침대는 넓고 둥글며 중앙에 장식이 새겨져 있음.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정교한 형태로, 고려시대 귀족의 차문화 수준을 보여줌.
부가 설명: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함께 차문화가 성행하며, 고려청자는 고급 제기로 널리 사용되었음.
특히 왕실 및 사찰 의식에서 중요한 도자기로 여겨졌음.
고려시대에는 불교와 함께 차문화가 성행하며, 고려청자는 고급 제기로 널리 사용되었음.
특히 왕실 및 사찰 의식에서 중요한 도자기로 여겨졌음.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융성했지만 조선시대 오면 유교의 사회가 되면서 불교가 약간 억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원들이 산으로 가잖아요.
조선초기: 관인차[다시제도와 다모]와 은둔차[고려의 유산과 승려]
조선초기: 관인차[다시제도와 다모]와 은둔차[고려의 유산과 승려]
그래서 운돈형으로 스님 중심으로 차문화가 계속 계승되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외국에서 차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지리산의 차가 지리산의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나 많은 것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에서 차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지리산의 차가 지리산의 차나무를 심었다고 하나 많은 것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진왜란 이후 쇠퇴 : 차를 구하기 어려움 많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함
영조시대 때는 차대신에 우리가 차례라고 하면 우리 지금도 술을 많이 올리지만 원래는 차를 올리는 예거든요.
대체 텍스트:
제목: 차례(茶禮)
제목: 차례(茶禮)
이미지 설명:
전통 한복을 입은 두 남성이 제사상 앞에 앉아 차례를 준비하고 있는 삽화.
한 사람은 잔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르는 모습.
제사상에는 떡, 과일, 생선, 고기, 나물, 탕, 전, 문서 등 다양한 제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음.
전통 한복을 입은 두 남성이 제사상 앞에 앉아 차례를 준비하고 있는 삽화.
한 사람은 잔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술병을 들고 술을 따르는 모습.
제사상에는 떡, 과일, 생선, 고기, 나물, 탕, 전, 문서 등 다양한 제물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음.
부가 설명:
차례란 고려 시대에 차(茶)를 제물로 올리던 제사 문화의 흔적으로, 본래 차를 올렸으나 조선 영조 이후로는 술이나 끓인 물로 대체됨.
현재의 명절 차례는 그 역사적 문화에서 유래한 것임.
차례란 고려 시대에 차(茶)를 제물로 올리던 제사 문화의 흔적으로, 본래 차를 올렸으나 조선 영조 이후로는 술이나 끓인 물로 대체됨.
현재의 명절 차례는 그 역사적 문화에서 유래한 것임.
그 영조때부터 차대신 술이나 끓인 물로 올리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재산이나 이런 의례용으로 썼던 것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근데 때때마다 뭐 상황에 따라 차를 올리기도 하고 술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술을 재산이나 이런 의례용으로 썼던 것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근데 때때마다 뭐 상황에 따라 차를 올리기도 하고 술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무사 집단들도 심신수양을 위해서 다도(茶道), 일본에 다도(茶道)는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체 텍스트:
제목: 다도(茶道)
제목: 다도(茶道)
이미지 설명:
전통적인 다도 복장을 입은 노인이 다기(찻잔, 다관 등)를 앞에 두고 다도 예법에 따라 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일본풍의 실내 공간에서 전통 다도 도구와 주전자, 찻잔, 대나무 거름망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음.
전통적인 다도 복장을 입은 노인이 다기(찻잔, 다관 등)를 앞에 두고 다도 예법에 따라 차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일본풍의 실내 공간에서 전통 다도 도구와 주전자, 찻잔, 대나무 거름망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음.
부가 설명:
다도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인 후, 좋은 찻잎으로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일상적이면서도 정갈한 생활 양식을 뜻함.
선(禪)과 같이 평상심을 중시하는 수행의 한 형태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에 도(道)의 의미를 담고 있음.
다도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인 후, 좋은 찻잎으로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일상적이면서도 정갈한 생활 양식을 뜻함.
선(禪)과 같이 평상심을 중시하는 수행의 한 형태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에 도(道)의 의미를 담고 있음.
다도를 통해서 심신수련을 장려하였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도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공들의 많이들 데려가서 도자기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공들의 많이들 데려가서 도자기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 텍스트:
제목: 조선시대 도공 납치
제목: 조선시대 도공 납치
이미지 설명:
오른쪽에는 두건을 두르고 수염을 기른 조선시대 도공이 가마 앞에 앉아 도자기를 굽고 있는 장면이 손그림 스타일로 묘사되어 있다.
왼쪽에는 배경으로 흐릿하게 다도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중앙에는 관련 설명 텍스트가 쓰여 있다.
오른쪽에는 두건을 두르고 수염을 기른 조선시대 도공이 가마 앞에 앉아 도자기를 굽고 있는 장면이 손그림 스타일로 묘사되어 있다.
왼쪽에는 배경으로 흐릿하게 다도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중앙에는 관련 설명 텍스트가 쓰여 있다.
설명 텍스트 요약: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다도 문화가 성행하면서 일본 장수들이 조선의 도공과 사기장들을 강제로 데려갔던 사건을 설명.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회(茶會)를 즐겼다는 배경과 함께,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를 설명함.
16세기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다도 문화가 성행하면서 일본 장수들이 조선의 도공과 사기장들을 강제로 데려갔던 사건을 설명.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회(茶會)를 즐겼다는 배경과 함께,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를 설명함.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추사 김정희와 초의선사가 차를 같이 나누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면서 화비께서 그린 그림이고요.
성현들은 모두 차를 사랑하였으니 차는 성인과 같아서 성품에 삿됨이 없네
차를 법대로 만들어 품평을 받고 옥병에 가득 담아 열 가지 비단으로 쌋네
물은 황하 최상의 근원에서 찾아 왔으니 여덟가지 덕을 갖추어 아름답기 한결 더하다
깊은 물 길어다가 가볍고 연한 맛을 한번 시험해보니 참되고 정수함이 조화되어 몸과 마음이 열리더라
추잡한 것 다없애고 정기가 스며드니 큰 道를 얻는 것이 어찌 멀겠는가
- 茶聖 帛衣禪師 茶時 中 -
[이미지 설명]
전통 복장을 입은 두 명의 인물이 방석 위에 마주 앉아 다다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왼쪽 인물은 합장한 자세로 예를 표하며, 오른쪽 인물은 찻잔을 건네고 있다.
주변에는 다기(찻주전자와 찻잔), 화로, 국화꽃, 석류, 문방구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배경 상단에는 한자로 된 시와 인장이 그려져 있다. 전통적인 동양화 스타일의 수묵담채화로, 선비의 차 문화와 선비정신을 표현한 장면이다.
草衣夜坐牕
秋虫茶席牀
古木聲更遠
閑窗氣自凉
多病如詩性
無聊任道場
茶三盞意厚
香一炷情長
차를 법대로 만들어 품평을 받고 옥병에 가득 담아 열 가지 비단으로 쌋네
물은 황하 최상의 근원에서 찾아 왔으니 여덟가지 덕을 갖추어 아름답기 한결 더하다
깊은 물 길어다가 가볍고 연한 맛을 한번 시험해보니 참되고 정수함이 조화되어 몸과 마음이 열리더라
추잡한 것 다없애고 정기가 스며드니 큰 道를 얻는 것이 어찌 멀겠는가
- 茶聖 帛衣禪師 茶時 中 -
[이미지 설명]
전통 복장을 입은 두 명의 인물이 방석 위에 마주 앉아 다다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왼쪽 인물은 합장한 자세로 예를 표하며, 오른쪽 인물은 찻잔을 건네고 있다.
주변에는 다기(찻주전자와 찻잔), 화로, 국화꽃, 석류, 문방구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배경 상단에는 한자로 된 시와 인장이 그려져 있다. 전통적인 동양화 스타일의 수묵담채화로, 선비의 차 문화와 선비정신을 표현한 장면이다.
草衣夜坐牕
秋虫茶席牀
古木聲更遠
閑窗氣自凉
多病如詩性
無聊任道場
茶三盞意厚
香一炷情長
花開茶熟日
秋水共長天
茶畫二三子
浮生學醉眠
秋水共長天
茶畫二三子
浮生學醉眠
金昌來 書
金日洙 印
[이미지 설명 끝]
金日洙 印
[이미지 설명 끝]
제주도에 보면 녹차밭이 있잖아요. 유기농으로된 녹차밭이 오설록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가서 아이스크림은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제주도의 오설록 : 오설록이란 이름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녹차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의 표현'과 'Origin of sulloc', 즉 이곳이 설록차의 고향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녹차를 판매하는 카페인 오설록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오설록 녹차밭 풍경 사진
제주도의 오설록 : 오설록이란 이름은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녹차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의 표현'과 'Origin of sulloc', 즉 이곳이 설록차의 고향이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녹차를 판매하는 카페인 오설록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오설록 녹차밭 풍경 사진
그런 녹차밭을 유기농차밭 조성해서 차문화를 조금 고급화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것을 현대에서 차문화를 이어오고 있고
현대: 오설록과 스타벅스 - 구례 녹차 · 제주 다원 등 녹차의 고급화,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 오설록의 유기농 차밭은 연간 11,176턴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과수작물 대비 3배 이상의 탄소 축적 효과가 있습니다.
차 나무는 인류에게 건강한 차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구의 건강한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설록과 스타벅스 - 구례 녹차 · 제주 다원 등 녹차의 고급화, 오설록 티뮤지엄
제주 오설록의 유기농 차밭은 연간 11,176턴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과수작물 대비 3배 이상의 탄소 축적 효과가 있습니다.
차 나무는 인류에게 건강한 차를 제공하며 동시에 지구의 건강한 환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의 어떤 원리 원칙 이치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면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그 잘 끓인 물과 좋은 차를 간 맞게 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다.
다도(茶道) : 다도(茶道)는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며, 그 잘 끓인 물과 좋은 차를 간 맞게 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이다.
찻잔을 씻고, 물을 길어 나르며, 목마를 때 마시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떠나 도가 있지 않다. 선도 또한 평상심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차와 선은 한 맛이 된다.
찻잔을 씻고, 물을 길어 나르며, 목마를 때 마시는 일일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떠나 도가 있지 않다. 선도 또한 평상심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차와 선은 한 맛이 된다.
한국의 다도는 사실은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고 찻잎을 정성스럽게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재배해서 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오행을 조화롭게 우리가 잘 운영하는 도가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그 잘 끓인 물과 좋은 차를 간 맞게
어떤 중용의 도에 맞춰서 간 맞게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오행을 조화롭게 우리가 잘 운영하는 도가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그 잘 끓인 물과 좋은 차를 간 맞게
어떤 중용의 도에 맞춰서 간 맞게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하여 마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인 거죠.
다례(茶禮) : 차를 마실 때의 예절은 편안히 즐겁게 마시는 것이다. 어떤 형식에 얽메어 차 맛을 모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차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다례(茶禮)이다.
차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다례(茶禮)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례(茶禮)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절이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스스로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마실 때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태도 그거 자체가 다례(茶禮)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저는 설명까지 마치겠습니다.
어떤 예절이 형식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 스스로 그리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마실 때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태도 그거 자체가 다례(茶禮)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맛있게 드시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저는 설명까지 마치겠습니다.